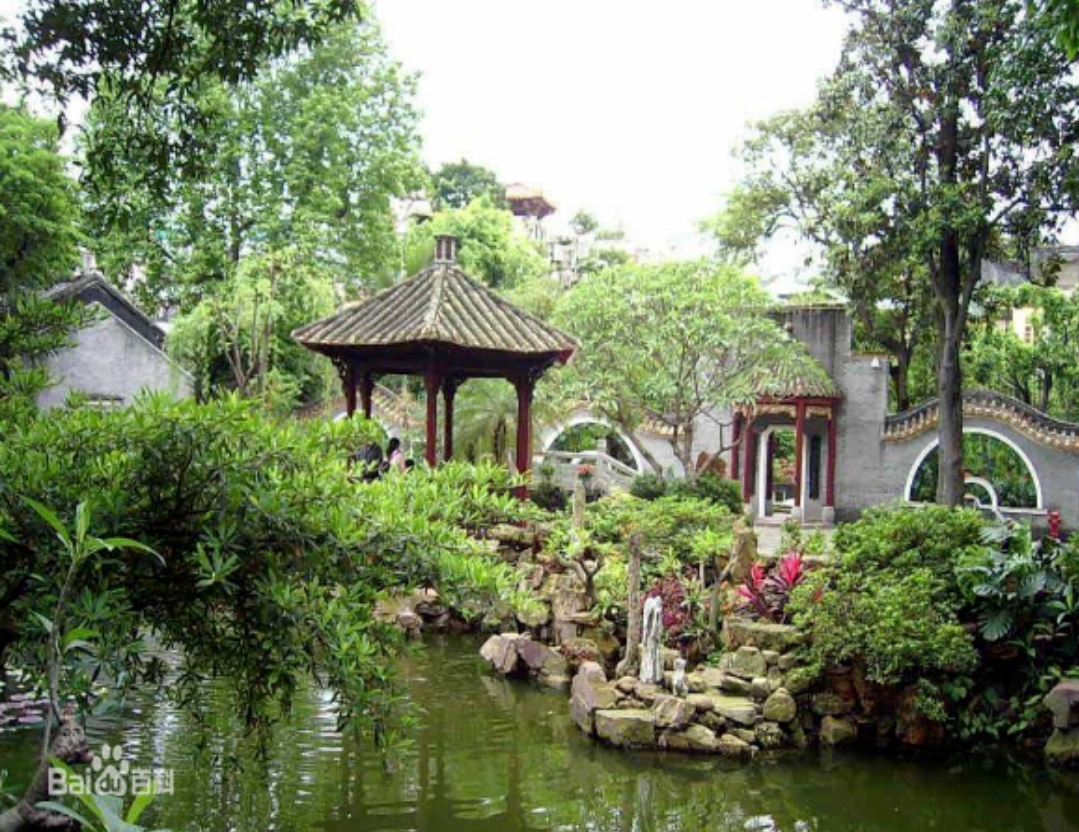淸平調詞 三首(청평조사 삼수)-李白(이백) 雲想衣裳花想容(운상의상화상용)春風拂檻露華濃(춘풍불함노화농)若非群玉山頭見(약비군옥산두견會向瑤臺月下逢(회향요대월하봉)구름을 보면 그대의 옷 같고꽃을 보면 그대의 얼굴인듯 하구나봄바람은 난간을 스치고이슬맺힌 꽃은 농염하기가 그지없네만일 군옥산 기슭이 본게 아니라면구슬 아로새긴 요대의 달빛 아래서 만난 그 선녀가 틀림없으리一枝濃艶露凝香(일지농염노응향)雲雨巫山枉斷腸(운우무산왕단장)借問漢宮誰得似(차문한궁수득사)可憐飛燕倚新粧(가련비연의신장)한떨기 농염한 꽃, 이슬은 향기로 엉기었고구름이 되고 비가 되겠다던 무산선녀도 애만 타잠시 묻노니, 그 옛날 한나라 궁실 미녀들어찌 그대와 비하리오아리따운 비연이 새로이 단장한 듯 하여라名花傾國兩相歡(명화경국양상환)常得君王帶笑看(상득군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