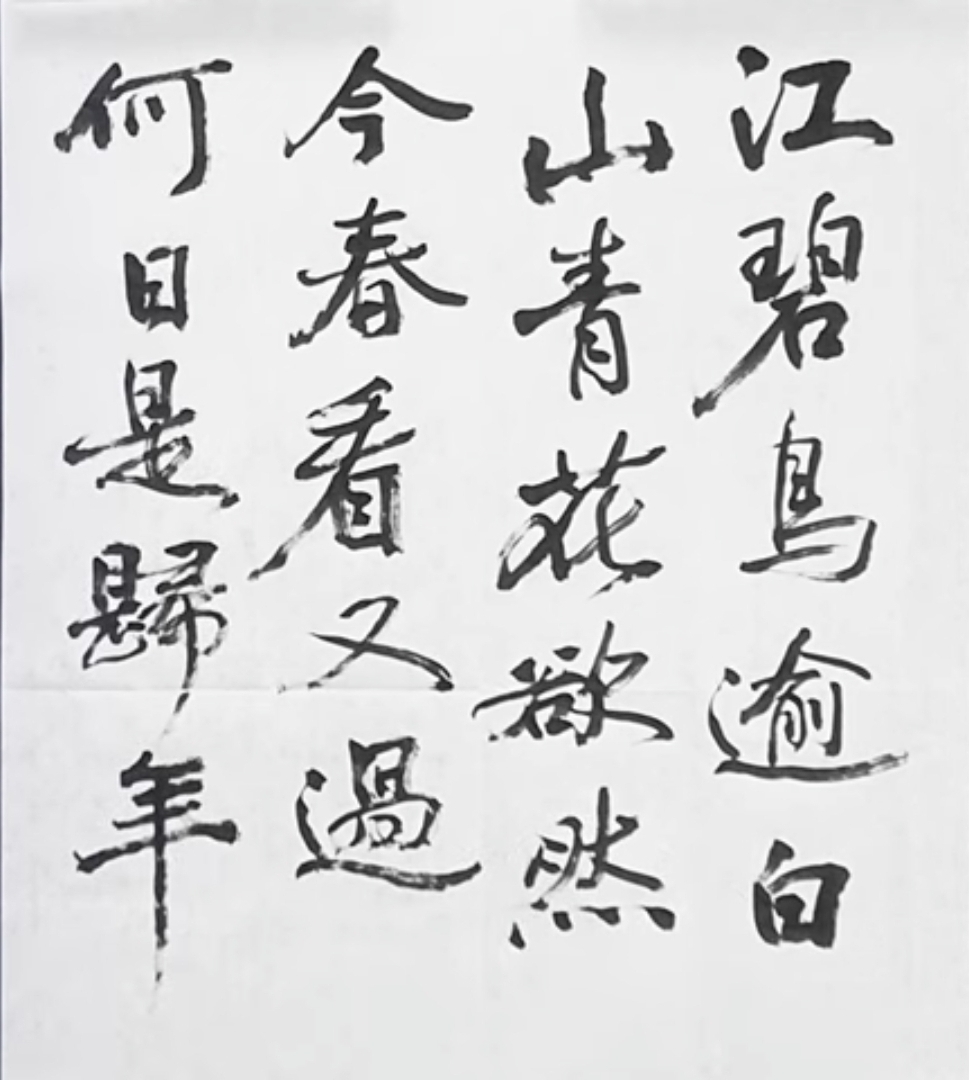龍野尋春-李齊賢
偶到溪邊藉碧蕪(우도계변자벽무) 春禽好事勸提壺(춘금호사권제호) 起來欲覓花開處(기래욕멱화개처) 度水幽香近却無(도수유향근각무) 우연히 시냇가에 다다라 푸른 풀을 깔고 앉으니 봄새들이 좋아하며 술을 들라 권하네 자리에서 일어나 꽃 핀 곳을 찾아 나서는데 물 건너오던 그윽한 향기 가까이 가니 온 데 간 데 없구나 *이 시는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인인 李齊賢(이제현, 1287년~1367년)이 지은 松都八詠(송도팔영) 가운데 제6수 龍野尋春(용야심춘)이다. 松都八詠(송도팔영)은 이제현이 송도의 명승을 생각하며 지은 8편의 시로, ‘鵠嶺春晴(곡령춘청), 龍山秋晩(용산추만), 紫洞尋僧(자동심승), 靑郊送客(청교송객), 熊川禊飮(웅천계음), 龍野尋春(용야심춘), 南浦烟蓑(남포연사), 西江月艇(서강월정)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