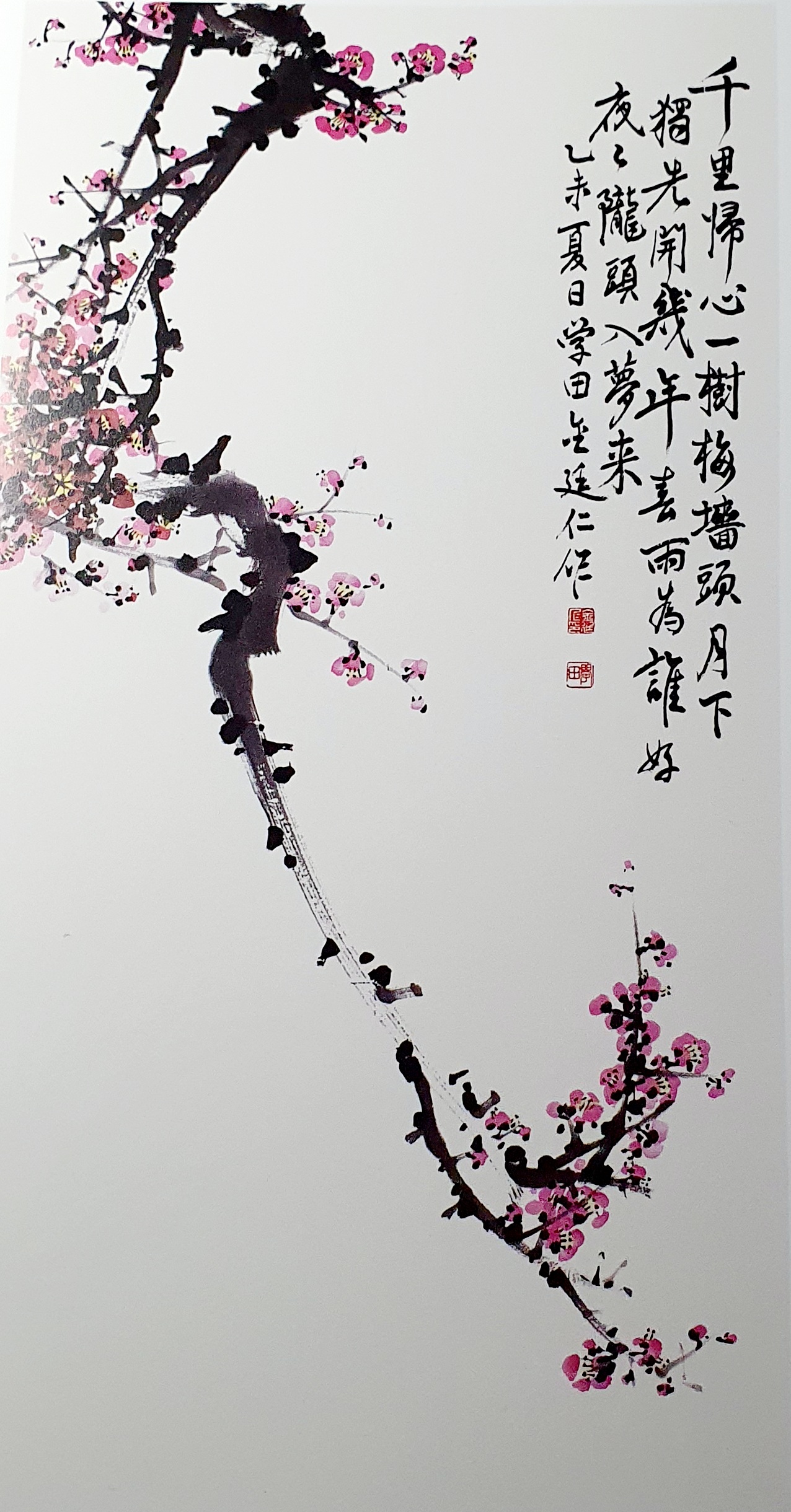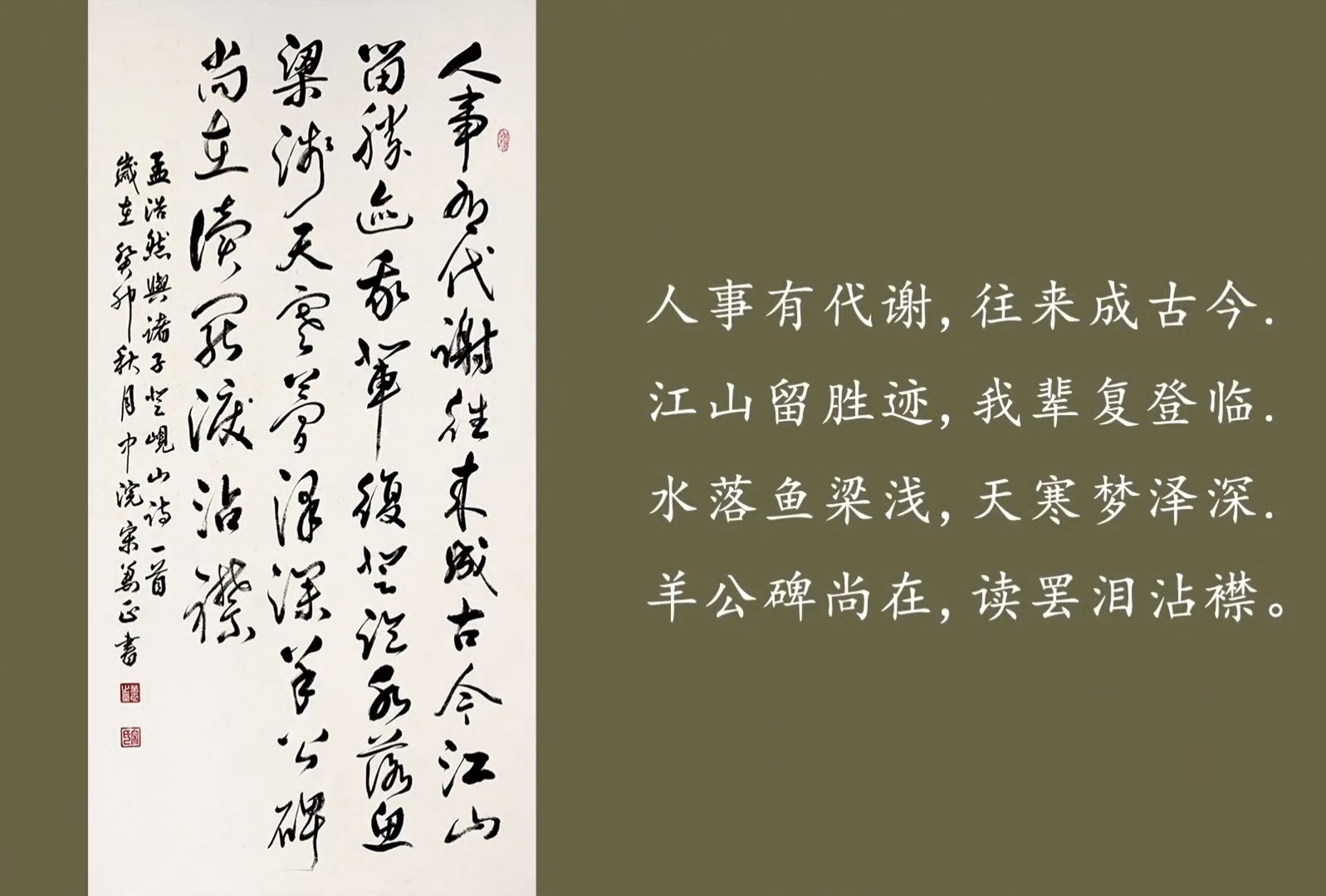움 돋는 풀잎 외에도 오늘 저 들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꽃 피는 일 외에도 오늘 저 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종일 풀잎들은 초록의 생각에 빠져 있다 젊은 들길이 아침마다 파란 수저를 들 때 그때는 우리도 한 번쯤 그리움을 그리워해볼 일이다 마을 밖으로 달려나온 어린 길 위에 네 이름도 한 번 쓸 일이다 길을 데리고 그리움을 마중하다 보면 세상이 한번은 저물고 한번은 밝아오는 이유를 안다 이런 나절엔 바람의 발길에 끝없이 짓밟혀라도 보았으면 꽃들이 함께 피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 꽃의 언어로 편지를 쓰고 나도 너를 찾아 봄길과 동행하고 싶다 봄 속에서 길을 잃고 봄 속에서 깨어나고 싶다 -/이기철 윌리엄 아돌프 부궤로 'Th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