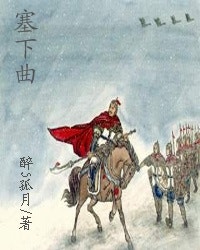塞下曲(새하곡)-王昌齡(왕창령)
[一]
蟬鳴空桑林(선명공상림),
八月蕭關道(팔월소관도)。
出塞入塞寒(출새입새한),
處處黃蘆草(처처황로초)。
從來幽幷客(종래유병객),
皆共塵沙老(개공진사로)。
莫學遊俠兒(막학유협아),
矜夸紫騮好(긍과자류호)。
매미가 빈 뽕나무 숲에서 울어대는
팔월의 소관(蕭關)길
변방을 나가고 들어오는 사이 날은 추워지고
곳곳마다 누런 갈대들
예로부터 유병(幽幷)의 군사들은
모두 사막에서 늙는다네
배우지 말라, 저 유협객들이
자류마(紫騮馬) 좋다고 자랑하는 것을
[二]
飲馬渡秋水(음마도추수),
水寒風似刀(수한풍사도)。
平沙日未沒(평사일미몰),
黯黯見臨洮(암암견림조)。
昔日長城戰(석일장성전),
咸言意氣高(함언의기고)。
黃塵足今古(황진족금고),
白骨亂蓬蒿(백골란봉호)。
〈이 수는 望臨洮(망림조)라고도 함〉
말에게 물 먹이며 가을 강을 건너는데
물은 차고 바람은 칼날 같네
너른 모래벌판에 해는 아직 지지 않아
어슴푸레 임조성(臨洮城)이 보이는구나
지난 날 장성(長城)에서의 싸움
모두들 의기충천했다 말하지
누런 모래는 예나 지금이나 가득하고
백골들은 들풀 사이에 뒤섞여 있네
[通釋] 음력 8월의 소관(蕭關)길을 행진하는데, 잎이 다 떨어진 뽕나무 숲에서 처연하게 우는 매미 소리가 들린다. 변방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동안 날은 문득 추워지고, 곳곳에 보이는 것은 누런 갈대뿐이다. 예로부터 유주(幽州)와 병주(幷州)의 풍속은 호협을 숭상하였는데, 그곳에서 온 군사들은 모두가 결국 사막에서 늙어갈 뿐이다.
그러하니 젊은이들이여! 용맹과 승리를 좋아하는 유협객들이 자신들의 무기와 자류마 자랑하는 것을 배우지 말지어다.
[解題] ‘塞下曲(새하곡)’은 ‘塞上曲(새상곡)’과 더불어 악부의 한 곡명으로 변방의 모습과 그에 대한 감회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 시는 왕창령이 출사 전 서북의 소관(蕭關)일대를 유람하면서 지은 작품으로, 네 수 중 첫 번째 수이다. 유주와 병주의 사막에서 늙어가는 병사들과 자기 말을 자랑하는 철없는 젊은이들을 대조시킴으로써 변방 수자리 생활의 고단함과 비애감을 드러내는 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뒤의 네 구는, 한(漢)나라 때의 횡취곡(橫吹曲)인 〈紫騮馬歌(자류마가)〉 (《古今樂錄(고금악록)》) 중 “열다섯에 정벌하러 갔다가, 팔십에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네.[十五從軍征 八十始得歸]”라는 구절과 함께 읽으면 맥락이 더욱 분명해진다.
*王昌齡(왕창령) : 698~757?. 장안(長安)사람으로 자(字)는 소백(少白)이다. 진사급제 후, 하남성 범수현(氾水縣)의 위(尉)가 되었다가 博學宏詞科(박학굉사과)에 합격, 비서성(秘書省) 교서랑(校書郞)이 되었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향리로 돌아갔다가 자사(刺史) 여구효(閭丘曉)에게 미움받아 살해되었다. 변새시(邊塞詩)와 규원시(閨怨詩)에 뛰어났으며, 저서로 《詩格(시격)》ㆍ《詩中密旨(시중밀지)》ㆍ《古樂府解題(고악부해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