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회고적오수 중 제4수 (詠懷古跡五首之四-두보(杜甫)
<고적에서 회포를 읊다 )>
[其四] 유비(劉備)
蜀主征吳幸三峽(촉주정오행삼협) :
촉나라 임금 오나라 치려고 친히 삼협에 왔다가
崩年亦在永安宮(붕년역재영안궁) :
붕어한 해에도 영안궁에 있었네.
翠華想像空山里(취화상상공산리) :
빈 산속, 그 때의 화려한 임금 행차 생각하니
玉殿虛無野寺中(옥전허무야사중) :
궁궐은 허무하게 들판의 절고
古廟杉松巢水鶴(고묘삼송소수학) :
임금의 옛 무덤, 삼나무와 소나무에 학들이 둥지 틀고
歲時伏臘走村翁(세시복납주촌옹) :
해마다 여름과 겨울의 제사에 촌로들이 달려가 제사하네.
武侯祠屋常鄰近(무후사옥상린근) :
무후 제갈량의 사당도 항상 같이 있어
一體君臣祭祀同(일체군신제사동) :
군신이 한 몸 되어 제사도 합께 받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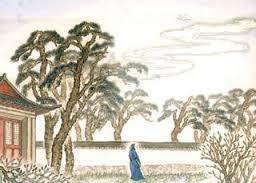
[通釋] 관우를 습격한 오나라를 치기 위해 촉나라의 왕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곳 기주까지 와서 오나라를 공격했었다. 하지만 유비는 오나라의 장수 육손에게 패해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이곳 기주로 돌아와 이듬해 영안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빈산에서 그 옛날 위엄 있는 의장을 여전히 상상해볼 수 있는데, 예전의 아름다운 궁전은 와룡사라는 절이 되어 그때의 영화는 사라지고 없다. 유비의 사묘(祠廟)에 있는 삼나무, 소나무에는 학들이 둥지를 틀어 살고 있을 뿐이다. 때가 되면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 이 땅의 노인들이 제사를 올린다고 지금도 사당에 온다. 제갈량의 사당 무후사가 선주의 묘당 옆에 붙어 있어 君臣을 한 몸으로 여겨 같이 제사를 올린다.
○ 앞의 네 구절 풀이:첫 구절은 빠르게 내달리는 우레가 산을 깨버리는 듯하니 얼마나 세찬 소리인가. 다음 구절은 지는 해가 빛을 거둬들이는 듯하니 또 얼마나 처량한가. 셋째 구절은 그 시절을 상상해 그려보는 것이고, 넷째 구절은 현재를 보고 실제로 웃는 것이다. 산 밖에서 어떻게 화려한 儀仗을 찾겠는가. 의중이 절에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玉殿(옥전)’이었건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간 없고 없다간 있어, 두 마디 말이 번쩍거리는 불꽃같이 일정치 않다. ‘翠華(취화)’, ‘玉殿(옥전)’은 기세 찬 소리의 극치이고, ‘空山(공산)’, ‘野寺(야사)’는 또 처량함의 극치이다. 단지 한 구절인데도 아래위로 갑자기 변하니 참으로 기이한 필법이다.
뒤의 네 구절 풀이:‘翠華(취화)’, ‘玉殿(옥전)’은 이미 볼 수 없고 보이는 것은 남아 있는 古廟(고묘)뿐인데, 세상을 떠난 昭烈帝(소열제:유비)는 천자였으니 묘당(廟堂)이 있을 터, 반드시 墳墓(분묘)와 太廟(태묘:천자의 조묘(祖廟))가 있고, 이른바 ‘깨끗한 현인들이 손님으로 와’ 마치 난새가 내려와 머무는 듯 해야 하는데, 지금은 물새들이 둥지를 틀었을 뿐이다. 천자의 廟堂(묘당)이 있어 제사를 지내니 반드시 八佾舞(팔일무)와 九獻(구헌:아홉 차례 헌주(獻酒)하는 것)이 있고, 이른바 郡公(군공)들이 술잔을 잡고 ‘준걸스러운 선비’들이 笏(홀)을 받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촌 노인들이 달려올 뿐이다. 廟祠 (묘사) 근처에는 ‘水鶴’, ‘杉’, ‘松’뿐이고, 제사를 같이 지내지만 촌 노인들이 ‘伏臘(복랍)’하는 것일 뿐이다. 임금과 일체가 된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체가 다른 임금과 신하가 구별되지 않음을 마음 아파한 것이다.
역주1> 蜀主窺吳幸三峽(촉주규오행삼협) : 삼국시대에 촉한(蜀漢)의 유비(劉備)가 장무(章武) 2년(222)에 오나라를 치러 출정한 사실을 말한다. ‘촉주(蜀主)’는 옛 칭호를 쓴 것으로, 〈詠懷古迹五首 其五〉에는 또 ‘한조(漢祚)’라고 썼으니, 촉(蜀)이 정통(正統)임을 나타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窺(규)’가 ‘征(정)’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幸’은 제왕의 행차를 말한다. ‘三峽(삼협)’은 기주(夔州)를 가리킨다.
역주2> 崩年亦在永安宮(붕년역재영안궁) : 유비는 오나라의 육손(陸遜)에게 패배하여 쫓겨 육로로 겨우 어복(魚復)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어복을 영안(永安)으로 개명했다. 유비는 이듬해 성도(成道)에 있는 승상(丞相) 제갈량(諸葛亮)을 부르고 4월에 영안궁(永安宮)에서 세상을 떠났다. ‘영안궁(永安宮)’은 기주(夔州) 백제성(百帝城)에 있는 행궁이다. 첫 구절에서는 ‘幸(행)’이라 하고 둘째 구절에서는 또 ‘崩(붕)’이라 했으므로 춘추필법에 따라 소열황제(昭烈皇帝) 유비를 정통으로 존숭한 표현이라 보기도 한다.
역주3> 翠華想像空山裏(취화상상공산리) : ‘翠華(취화)’는 비취새의 깃털로 장식한 깃발을 말하며 帝王의 의장(儀仗)을 가리킨다. ‘空’이 ‘寒’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역주4> 玉殿虛無野寺中(옥전허무야사중) : ‘玉殿(옥전)’은 영안궁(永安宮)을 가리킨다. ‘野寺(야사)’는 臥龍寺(와룡사)를 가리킨다. 원주(原注)에 “궁전은 지금 와룡사가 되었다. 묘당(廟堂)은 궁전 동쪽에 있다.[殿今臥龍寺 廟在宮東]”라고 하였다.
역주5> 古廟杉松巢水鶴(고묘삼송소수학) : ‘古廟(고묘)’는 유비의 祠廟(사묘)를 말한다.
역주6> 歲時伏臘走村翁(세시복랍주촌옹) : ‘歲時伏臘(세시복랍)’은 여름 겨울 두 차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伏(복)’은 음력 6월의 夏祭를, ‘臘(랍)’은 음력 12월의 冬祭를 말한다.
‘走村翁(주촌옹)’은 이 지역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것을 말하는데 아직도 유비를 그리워하며 잊지 못함을 나타낸다.
역주7> 武侯祠屋常隣近(무후사옥상린근) : ‘武侯祠(무후사)’는 기주(夔州)에 있는 제갈량(諸葛亮)의 사묘(祠廟)를 가리킨다. 제갈량(諸葛亮)이 무향후(武鄕侯)로 봉해졌기 때문에 무후사(武侯祠)라 한 것이다. ‘常’이 ‘長’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隣近(인근)’이란 표현을 쓴 것은 무후사(武侯祠)가 선주묘(先主廟)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역주8> 一體君臣祭祀同(일체군신제사동) : ‘一體君臣(일체군신)’은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란 전통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만, 유비와 제갈량이 서로 君臣으로서 뜻이 잘 맞았음을 나타낸다. ‘祭祀同(제사동)’이라 하였지만, 안은 궁(宮)이고 밖은 전(殿)이며 임금은 묘(廟)이고 신하는 사(祠)여서 그 차서가 분명하다. 王褒(왕포)의 〈四子講德論(사자강덕론)〉에 “임금은 머리이고 신하는 팔다리이니 그 한 몸이 서로 갖춰져야 완성됨을 밝힌 것이다.[君爲元首 臣爲股肱 明其一體 相待而成]”라는 말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