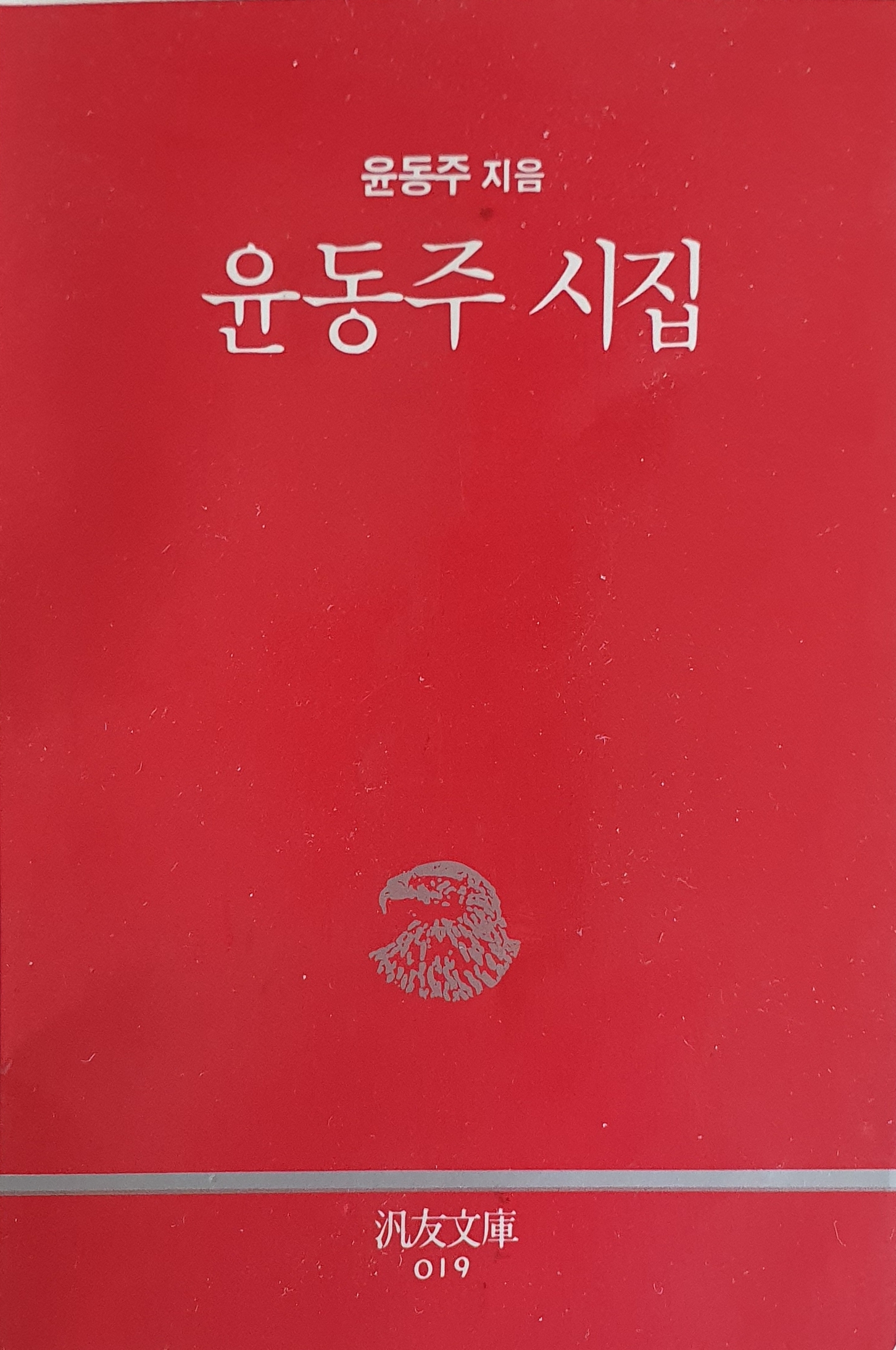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우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윤동주론 / 임헌영
윤동주의 생애와 시
윤동주가 시를 썼던 시대인 1936~1943년은 온 인류가 시를 외면한 시대였다. 그가 즐겨 바라보던 하늘과 바람과 별의 허공엔 공습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던 시절이었다.
이 시대엔 고향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었고, 친한 벗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까지도 감시를 받았다. 하물며 창씨 개명도 하지 않은 '순이'나 '흰 옷', '희망의 봄' 같은 단어는 영락없는 불순한 표현이었다.
이런 한국 문학사의 '암흑기'에 윤동주는 뛰어난 시인이었다. 흔히들 시인 윤동주를 저항시인이라고 부른다.
저항문학인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문학인 자신이 단체나 결사 등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
둘째, 일시적인 의무나 지원 세력으로 어떤 단체나 운동에 뛰어든 경우.
셋째, 직접 운동권에 가담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문학작품으로 정서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경우.
윤동주는 세 번째에 해당하며 그의 작품은 깊은 서정과 민족 정서에 뿌리를 박고 있다.
누군가는 윤동주에게 왜 윤봉길이나 안중근처럼 되지 못하고, 하다못해 이육사처럼 비밀결사에라도 참여하지 못했느냐고 하겠지만 옥사(獄死) 그 자체가 윤동주의 시문학 전체를 대변해준다. 그의 순수한 시가 곧 역사적 저항의지의 표현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혹독한 식민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저항시는 진정한 영혼의 고통을 겪는 사람만이 아는 순수한 고뇌의 절규가 스며 있으며, 끝모를 고뇌의 깊이 속에 '순수 저항시'의 참된 가치가 스며 있다. 이런 시는 누구를 선동하지는 않으나 감명을 주며, 울리지는 않으나 가슴을 찌르며, 취하지는 않으나 각성제가 된다.
또한 윤동주의 시 속에는 감상적인 요소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허무주의가 아닌, 생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인 자세가 스며 있다.
윤동주가 오늘의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호소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의 서정성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