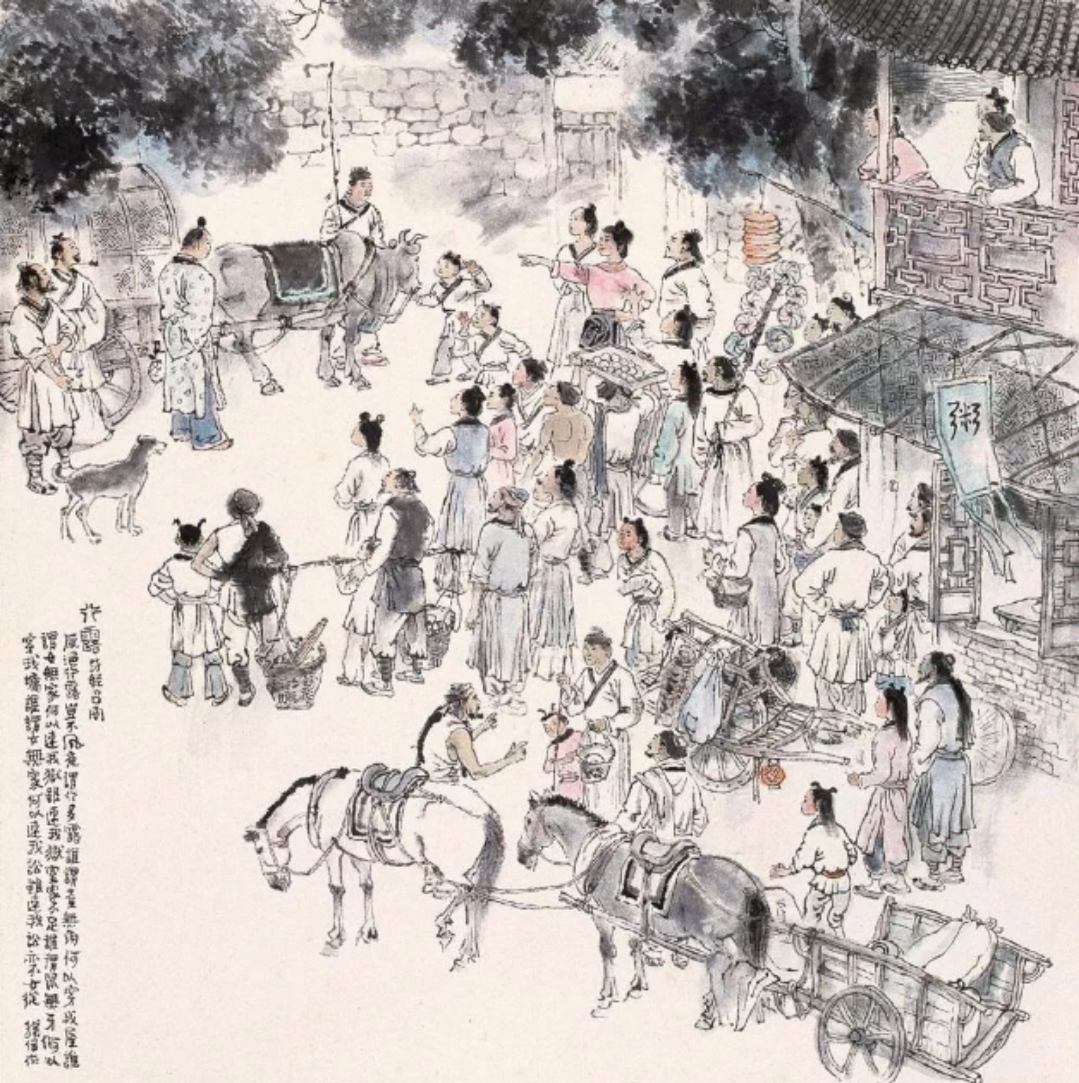
이슬길(행로行露)-시경 국풍 소남
함초롬히 젖은 이슬길을
이른 아침 늦은 밤에 어찌 다닐 수 없겠습니까만
길에 이슬이 많아 젖을까 해서지요.
누가 참새에게 부리가 없다 했나요
없다면 어떻게 우리 지붕 뚫었나요
누가 그대에게 혼인의 예 없다 했나요
있다면 어째서 나를 소송에 불렀나요
아무리 소송해서 불러내도
그대에게 시집가진 않으려오
누가 쥐에게 어금니가 없다 했나요
없다면 어떻게 우리 담장 뚫었나요
누가 그대에게 혼인의 예 없다 했나요
있다면 어째서 나를 소송에 불렀나요
아무리 소송해서 불러내도
그대를 따르지는 않겠다오
*여자가 예의 없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며 노래한 시이다. 이슬길은 험한 세상 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참새의 부리는 쪼라고 있는 것이고, 쥐의 어금니는 갚으라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입이 있으면서 직접 내게 얘기 안 하고 소문만 무성하게 내고 소송이나 한단 말인가?
<行露>
厭浥行露 豈不夙夜 謂行多露
읍읍행로 기불숙야 위행다로
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
수위작무각 하이천아옥
誰謂女無家 何以速我獄
수위여무가 하이속아옥
雖速我獄 室家不足
수속아옥 실가부족
誰謂鼠無牙 何以穿我墉
수위서무아 하이천아용
誰謂女無家 何以速我訟
수위여무가 하이속아송
雖速我訟 亦不女從
수속아송 역불여종
厭(염,엽,암,읍) : 젖다, 축축하다(읍)
浥(읍,압) : 물이 배어 축축하다. 적시다
行(행) : 길, 도로
夙夜(숙야) : 이른 아침과 늦은 밤/
밤낮, 시시각각, ‘일찍 길을 나서는 것’
謂(위) : 畏의 가차로 길에 이슬이 많아 무섭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 있다.
雀(작) : 참새
角(각) : 새 부리
何以(하이) : 무엇으로, 어떻게, 왜
穿(천) : 뚫다, 구멍을 내다
女(여) : 너(汝)
家(가) : 결혼하여 성가하다,
速(속) : 부르다, 초래하다
獄(옥) : 감옥, 옥사
室家(실가) : 집 외에 장가를 들다, 세간살이(傢) 가정을 꾸리는 예를 위해 매파를 찾는 것, 여기서는 결혼을 할 이유 등등이 있다.
鼠(서) : 쥐
牙(아) : 이빨
墉(용) : 담
訟(송) : 송사, 獄과 같다.
亦不女從는 亦不從女의 도치다.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은 분분하다.
<毛詩序>는 “소백(召伯)이 송사를 심리하는 것으로 어지러운 풍속이 사라지고 정숙과 신의의 가르침이 일어나, 강폭한 남자가 정숙한 여자를 욕보일 수 없도록 하였다”고 적었고
<한시외전> <열녀전,정순편>은 모두 여자가 성혼이후 남자가 혼례를 준비하지 못해 비록 송사를 신청하였으나 이루지 못함을 적은 노래라 한다.